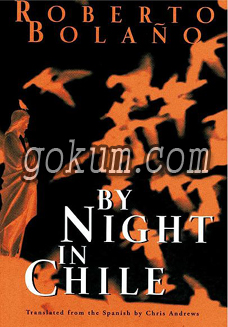
인류사를 되돌아보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잔인한 순간들이 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 당시 일어난 인종청소나 르완다 내전과 같은 일들이 그러하다. 그리고 이런 잔인한 사건들을 접하면서 드는 의문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그 사회의 지식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칠레의 문인 로베르토 볼라뇨는 그의 소설 칠레의 밤을 통해서 그런 암흑의 시기에 지식인의 책무가 무엇인가를 날카롭게 묻고 있다.
소설의 주인공인 이바카체(필명)는 사제이며 문인이다. 그는 유럽문학에 통달해있고, 신학 및 철학에도 조예가 깊다. 그는 밝은 달빛 아래서 이탈리아 시인들의 시를 읊조릴 수 있고, 유럽의 오래된 성당들을 돌아보며 그 아름다움을 음미할 줄 안다.
이렇게 훌륭한 지식인이자 교양인인 이바카체는 소설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으로 등장하여 그의 한 평생을 회고한다. 하지만 칠레의 근현대사를 그의 일생과 겹쳐보면 과연 이바카체의 삶이 고상하고 지적이기만 하였는가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만약 그가 살아냈던 역사를 지워버린다면 그는 그저 존경받을 만한 학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살아간 역사라는 텍스트다.
그는 칠레 농민들이 땅의 분배를 요구하며 거대 지주들과 갈등하던 시절에 칠레 문학의 미래를 논하며 바로 그 농장에서 문인들과의 파티를 즐겼다. 그는 칠레가 사회주의 정권을 탄생시키며 극도로 첨예한 사회갈등을 경험할 때 그리스 고전들을 다시 읽어간다. 이후 피노체트 장군에 의한 군사 쿠데타가 성공하고 많은 이들이 암살당하거나 망명의 길을 떠날 때 그는 비로소 오랫동안 읽었던 고전들을 내려놓으며 세상이 참으로 조용하고 한가롭다고 중얼거린다.
이후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피노체트 군사정권 하의 칠레를 통금 때문에 약간 불편했던 시절로만 기억한다. 물론 그가 통금을 항상 지켰던 것은 아니다. 그는 통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문인들의 파티에 종종 나타났다. 놀라운 사실은 문인들의 파티가 밤새도록 벌어지던 그 저택의 지하실에서 반정부 인사들이 고문당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가온 죽음을 예견하는 이바카체는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며 끊임없이 “해결책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바카체가 노력하였던들 거대한 칠레의 역사 속에서 과연 그에게는 해결책이 있었을까? 그가 생각하기에 그에게는 해결책이 없었다.
대학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지식인으로 성장해나간다. 지식인이라는 훌륭한 명칭은 하지만 상당히 무거운 책임을 요구한다. 언제 어떻게 지식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인지를 알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칠레의 밤을 통해 볼라뇨는 칠레의 지식인들 뿐 아니라 세계의 지식인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어쩌면 이바카체라는 인물은 어디에나 있고 동시에 우리들 안에 존재하는 인물일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대학교육이 보편화되고 지식인들이 늘어나는 오늘날에도 잔혹하거나 부정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늘어나는 지식인들의 가슴 속에 이바카체가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 한 권의 소설을 통해 나는 미래의 지식인으로 성장할 학생들이 지식인이라는 명칭이 주는 책임이 대해 겸손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