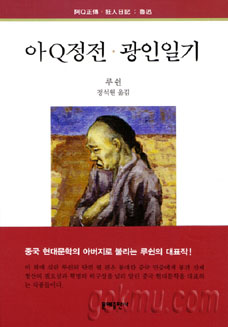
중국 최초의 백화소설로 일컬어지는 루쉰의 「광인일기」는 1918년 5월에 발표되었다. 이 작품이 발표되던 당시 중국은 변혁의 바람 속에서 출렁이고 있었다. 특히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진보적인 지식인들의 노력은 문학예술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루쉰은 봉건관념에 찌든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자신의 노력이 계속 벽에 부딪히는 것을 보면서 실망과 환멸에 빠져 있었기에, 문학에 이는 변화의 바람에도 별다른 열정을 나타내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그의 절망적인 심정은 중국과 중국인을 강철로 만든 방과 그 안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로 비유한 데에서 잘 나타난다.
문학혁명에 동참해달라는 친구에게 그는 “강철로 만들어진 방 속에서 사람들이 자고 있다. 이들은 곧 질식해 죽겠지만 그들을 깨워봤자 결국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죽음의 고통만 안겨줄 터인데, 깨울 필요가 있겠냐”는 말로 거절한다.
이런 그를 친구는 몇 사람이라도 깨어나면 그 방을 부술 희망이 생길 것이라고 설득하고, 그는 결국 문학혁명에 동참하기로 결심한다. 이렇게 하여「광인일기」가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 제목에서 나타나듯, 이 작품은 한 광인의 일기로, 자신의 가족을 포함한 마을 사람들이 다 사람을 잡아먹고 있다는 고발과 이를 고쳐야 한다는 절절한 호소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어떻게 계속되면서 일상화될 수 있었을까. “여태껏 그래왔으니” 어쩔 수 없다는, 심지어 당연하다는 사람들의 인식 때문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래왔다면 옳은 것인가”라는 물음과 함께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지 않는 참인간이 되라”는 그의 외침은 미친 소리로 치부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 기실 광인은 봉건적인 전통 관념이 얼마나 사람을 억압하는지 깨달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혼자였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는 사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지도 못했고, 그는 미친 사람으로 낙인찍혀 주변으로부터 배제당하고 말았다.
자각한 사람을 광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사회로부터 거부당한 광인이 “다 나아서” 사회로 복귀했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불합리한 현실을 깨달은 사람을 그가 바꾸고자 한 현실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사회야말로 얼마나 어두운 곳인가.
「광인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다른 각도에서 사물을 읽어야 할 필요성을 던져준다. 당연함 또는 다수라는 단어를 합리적, 절대적, 옳은 것 등등과 은연 중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기. 혹, 잘못된 것임에도,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여태껏 그래왔으니”라는 말로 잘못된 관념이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옛날부터 그래왔다면 옳은 것인가”라는 물음을 그냥 헛소리로 무화(無化)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그 물음을 “여태껏 그래왔으니까”라는 목소리 속으로 침몰시켜버리는 데에 함께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